이전으로 돌아가기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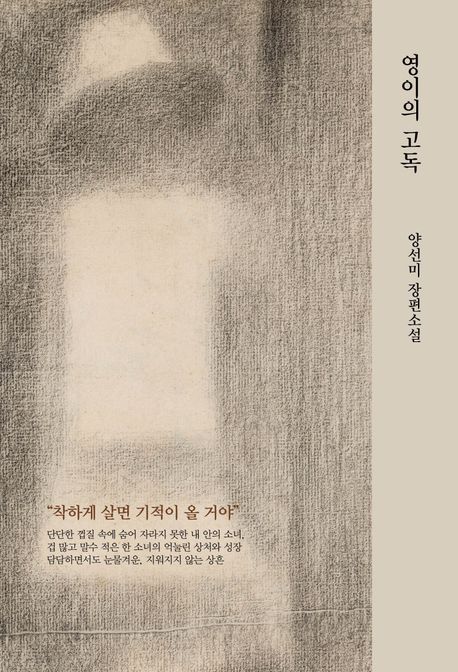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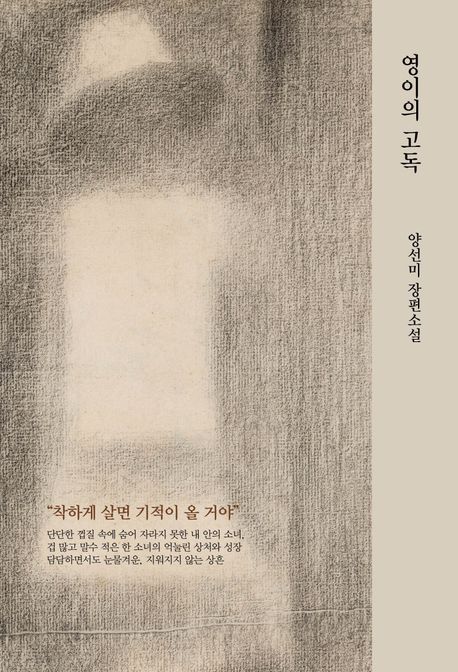
영이의 고독
소장정보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서비스 신청 |
|---|---|---|---|---|---|
| ANM000109202 | 813.7 양917ㅇ | 종합자료실 일반도서 |
대출가능 | - | 도서예약불가 |
도서소개
도서정보 상세보기
NAVER 제공
“15년 전 야간학교에 함께 다니던 친구를 찾습니다”
어디에도 없었고 어디에나 또 있던, 우리 안의 오랜 동무 이야기
“조용한 아이는 눈에 띄지 않고, 말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들키지 않는다. 양선미의 소설이 고집스럽고 끈질기게 파고드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소설가 김별아의 평에 걸맞게, 양선미의 소설 『영이의 고독』은 우리라는 영역 한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을 가리고 있던, 어떤 존재에 대해 다룬다.
그이, 또는 그것은 이재에 밝지도 욕망에 솔직하지도 못하다. 불의 앞에서 과감하거나 어떻게든 끈기 있게 버텨내는 유형과도 거리가 멀다. 이 가냘픈 생명으로 만든 이야기는 심장을 두들기는 투쟁기도, 배우와 관객을 모두 쓰러뜨리는 비극도, 주인공이 드문 성공을 움켜쥐는 영웅서사도 될 수 없다. 단지 사람들 누구에게나 드리워 있는 아픔과 고독을, 현대사회의 상흔을 품은 어느 가슴을 그려낼 뿐이다. 단지 그것으로써 “선량한 사람의 고독한 생(生)은, 과장 없이 소설이 된다”(소설가 오현종).
이 소설의 영이처럼 자신의 속내를 꺼내지 않고 자신을 어필하지 않는 타인에게서, 역시 평범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영이의 고독』은 우리가 늘 망각하는 사실을 세밀히 짚어나간다. 영이와 같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그래서 당연히 핵심적인 위치에서 우리를 늘 보살펴 왔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런 타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아주 내밀한 구석의 무엇과도 꼭 닮았음을 상기시킨다. 그렇게 우리는, “소설을 다 읽고 난 뒤 곁을 스쳐간 수많은 ‘영이들’을 떠올린다”(소설가 하성란).
이 책의 다대출 이용자 그룹
최근 6개월 간 대출을 가장 많이 한 연령 및 성별입니다.
해당 데이터가 없습니다.